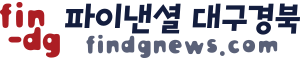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 살림을 쥐는 사무총장에 TK(대구·경북) 재선 정희용 의원(49), 정책 생산 컨트롤타워인 정책위의장에 PK(부산·경남) 중진 김도읍 의원(61·4선)을 내정했다.
표면적으로는 “세대·지역 안배를 통한 역동성 회복”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공천‧정책 ‘투톱’을 대표 직속 라인으로 정렬하는 주도권 확보 인사라는 평가가 힘을 얻는다.
사무총장은 재정과 인사, 조직·공천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당내 핵심 보직이다. 정희용 의원은 국회 보좌진과 경북도지사 경제특보를 거친 실무파로, 주호영·윤재옥·추경호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두루 지내며 지도부 핵심과의 교감 채널을 확보해 왔다.
40대 TK 재선을 ‘총장’에 앉힌 건 공천 시스템 장악과 조직몰입을 동시에 노린 카드로 읽힌다. “대표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한다”는 당 설명은, 곧 대표-사무총장 간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예고한다.
정책위의장에 내정된 김도읍 의원은 검사 출신의 4선 중진으로 법사위원장과 과거 정책위의장을 지낸 경력의 ‘정책·사법 라인’ 에이스다. 계파색이 옅다는 평을 등에 업었지만, 이는 동시에 대표체제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관리형 정책 사령탑’이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당은 “민생 역량”을 강조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당·정부와의 정책 각(角) 세우기와 대야(對野) 메시지 전면전을 조율할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될 공산이 크다.
결국 이번 인선은 공천(사무총장)과 메시지·정책(정책위의장)을 대표의 직선 체계로 끌어당기는 ‘원포인트 권력 재배치’다.
TK의 젊은 실무형과 PK의 노련한 정책형을 전면에 세워 ‘안배’의 외피를 씌웠지만, 실질은 대표 중심의 통제력 강화다. 최근 당내외 현안에서 장 대표가 강조해온 ‘주도권 프레임’—대통령·여야 회동 방식과 의제 설정을 둘러싼 기싸움 등—과 궤를 같이한다.
문제는 리스크 관리다.
첫째, 공천 공정성 논란이다. 총선보다 ‘조직 선거’ 성격이 강한 지방선거에서 사무총장-대표 직결 라인 가동은 효율성을 높이지만, 그만큼 친대표계 편향·사천(私薦) 의혹에 취약하다.
공천룰 설계와 심사·재심의 절차에서 견제 장치와 투명성을 얼마나 제도화하느냐가 시험대다.
둘째, 정책 경쟁력이다. 김도읍 체제의 장점은 법·제도 설계력과 메시지 전투력이나, 민생 어젠다는 세부 수치·재원·시행 로드맵이 뒷받침돼야 한다. ‘반(反)경제·반민주’ 프레임 공방만으로는 수도권 MZ·중도층 이탈을 되돌리기 어렵다.
셋째, 지역 균형의 역설이다. TK- PK 안배가 내부 균열을 봉합하는 듯 보여도, 수도권·충청권의 존재감 약화가 감지될 경우 내년 선거의 최대 격전지에서 전략적 공백을 노출할 수 있다.
형식상 사무총장은 최고위 의결,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추인을 거친다. 그러나 관건은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 견제와 균형이다.
최고위·정책위·공천기구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되, 대표-사무총장 라인의 집중화가 ‘원팀’으로 수렴될지, 아니면 비주류 반발과 지역·계파의 미세한 반동을 부를지는 향후 조직개편·공천룰 공개 국면에서 드러난다.
요컨대 이번 인선은 ‘장식적 안배’보다 ‘실질 권력 재편’의 성격이 짙다.
장동혁 대표는 공천과 정책이라는 두 축을 자신의 호흡에 맞춰 재배열하며 내년 지방선거까지의 작전지휘권을 손에 쥐려 한다.
남은 숙제는 명확하다. 공정한 공천 설계, 데이터에 기반한 민생 정책 패키지, 수도권 맞춤형 인재·메시지 전략을 얼마나 빨리,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다. ‘주도권 확보’가 목표라면, 이제는 성과로 증명할 차례다.